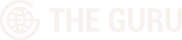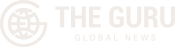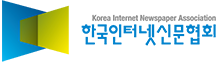-

中 EVE에너지, 나트륨배터리 사업부·AI로봇 연구센터 설립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EVE에너지가 광둥성에 10억 위안(약 2000억원)을 투자한다. 연간 2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시설과 로봇·인공지능(AI) 센터를 구축한다. 로봇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으로 주목받는 나트륨이온 시장을 공략한다. EVE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 본부와 로봇 AI 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투자비는 총 10억 위안이다. 약 9만 ㎡ 부지에 나트륨이온 배터리 연구개발(R&D)와 파일럿 플랜트,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선다. 연간 생산능력은 2GWh 규모다. 또한 로봇 연구부터 테스트, 양산, 훈련으로 이어지는 5만 ㎡ 규모의 로봇 AI 센터도 설립한다. EVE에너지는 상용화된 로봇을 활용해 지능화된 배터리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로봇을 도입하는 추세다. 앞서 중국 CATL은 현지 AI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스피릿AI(Spirit AI·千寻智能)'로부터 '모즈'를 인도받아 중저우 공장에 배치한 바 있다. 배터리 팩 생산라인에 활용하고 자동화를 꾀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둘러싼 업계 경쟁도 치열해
- 오소영 기자
- 2025-12-27 07:52
-

美·中·獨 배터리 합작사, 미국에 LFP 배터리셀 제조 공장 착공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과 중국, 독일 등 3국 주요 기업들이 미래 배터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뭉쳤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 탈탄소화로 인해 차량 중 전기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용차 시장을 공략한다.
- 정예린 기자
- 2024-07-06 07:30
-

中 EVE에너지, 정의선 회장이 점찍은 리막과 '맞손'
[더구루=윤진웅 기자] 중국 리튬 배터리 기업 EVE에너지(이하 EVE)가 크로아티아 하이퍼 전기차 브랜드 '리막 오토모빌리'(이하 리막)와 손 잡고 배터리 셀 공동 생산에 나선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양사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EVE는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뮌헨 모터쇼(IAA Munich Motor Show)를 통해 리막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유럽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셀을 공동 생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EVE는 46XX 원통형 배터리 셀 제조를, 리막은 EVE가 제조한 배터리 셀을 통합하는 배터리 모듈의 설계와 생산을 맡는다. 각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토대로 우수한 품질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파트너십의 중요한 요소는 리막의 46XX 플랫폼이다. 폭스바겐과 포르쉐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와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고안된 이 플랫폼은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뛰어난 에너지 밀도와 맞춤형 셀-모듈 솔루션, 정교한
- 윤진웅 기자
- 2023-09-11 08:03
-

中 EVE에너지, 세계 3대 자전거 전시회서 4695 배터리팩 공개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EVE에너지가 독일 자전거 전시회에서 '4695 배터리팩'을 공개했다. 높은 에너지밀도와 고속 충전을 자랑하는 배터리를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양산하고 유럽에서 수주를 노린다.
- 오소영 기자
- 2023-07-01 07:42
-

中 탄산리튬, 반년도 안 돼 30% 이상 폭락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5개월 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배터리 업체들이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펼치며 탄산리튬의 가격 하락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카이 글로벌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6일(현지시간) t당 40만 위안(약 757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60만 위안(약 1억1350만원)에서 33%나 빠졌다. 탄산리튬은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원재료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탄산리튬 가격은 10배가량 급등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업계들도 줄줄이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 수요가 부진하고 미국 앨버말과 칠레 SQM 등 글로벌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며 가격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 내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는 40만8000대로 2년 전인 2021년 1월에 대비 6.3% 줄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마저 할인 정책을 펼치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중국 배터리 업계 선두인 CATL은 지난달 올해 3분기부터 3년 동안 탄
- 오소영 기자
- 2023-03-10 07:48
-

SK온 양극재 합작공장, 中 EVE에너지에 공급
[더구루=정예린 기자] SK온이 중국 EVE에너지, BTR과 함께 설립한 양극재 합작공장이 EVE에너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이 잇따라 결실을 맺으며 배터리 생태계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VE에너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이사회에서 내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심의·승인했다. '창저우 BTR 뉴머티리얼 테크놀로지(이하 창저우 BTR)'로부터 2700만 위안(약 51억원) 규모 양극재, 극코일 등 원재료를 구입한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SK온 옌청 공장이 거래 주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옌청 공장은 소재가 아닌 배터리 완제품 생산·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인 만큼 창저우 BTR이 원재료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온 옌청 공장과 창저우 BTR 모두 EVE에너지의 관계사다. SK온 옌청 1공장은 단독 생산거점인 2공장과 달리 EVE에너지와 합작 형태로 운영된다. 창저우 BTR은 SK온이 25%, EVE에너지가 24%, BTR이 5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합작사다. 올 7월 창저우 소재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양산에 돌입했다. 이밖에 SK온과 EVE에너지는 광둥성 후이저우에도 10GWh급 배터
- 정예린 기자
- 2022-12-07 11:12
-

中 EVE에너지, BMW 선양 배터리 공장에 셀 공급 추진
[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 EVE에너지(EVE Energy)가 BMW의 현지 배터리 공장에 셀 공급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셀 납품이 유력한 가운데 삼성SDI, CATL과 함께 BMW의 3대 배터리 공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예린 기자
- 2022-11-29 15:48
-

中 배터리업계 감산설 일축…'고공행진' 리튬 가격 "문제 없다"
[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연일 치솟고 있는 리튬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소문을 부인했다. 우려와 달리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증산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 정예린 기자
- 2022-11-16 10:52
-

'SK온 파트너사' EVE에너지 "3년 내 말레이시아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
[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 EVE에너지(EVE Energy)가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전기차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동남아시아 공략을 본격화한다.
- 정예린 기자
- 2022-10-25 16:18
-

SK온 中옌청 배터리 제1공장 풀가동 돌입
[더구루=정예린 기자] SK온의 중국 장쑤성 옌청 배터리 제1공장 풀가동에 돌입했다. 생산량을 확대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중국 EVE에너지와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옌청 1공장 추가 용량에 대한 증설을 마무리하고 지난 4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생산능력은 기존 10GWh에 17GWh를 더해 총 27GWh로 늘어났다. SK온은 지난 2019년 EVE에너지와 각각 5799억원, 5억2500만 달러(6200억원)을 출자해 옌청 합작공장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듬해 추가 투자를 단행해 후이저우에 공장을 갖춘 EVE 자회사 지분 49%도 취득했다. 양사는 옌청 외에 광둥성 후이저우에도 10GWh 규모 배터리 합작공장을 두고 있다. 옌청 1공장 설립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해 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고 10GWh 규모 용량에 대해 가동을 시작했다. 증설까지 마무리하며 3년여 만에 완공했다. SK온은 옌청에 제2공장도 짓고 있다. 25억3000만 달러를 투입해 연간 3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고성능 전기차 약 45만 대에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다. 올 1월 착공식을 열고 건설을 시작했
- 정예린 기자
- 2022-08-04 14:06
-

[단독] SK온, 中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공장 양산 돌입…연산 전기차 47만대분
[더구루=오소영 기자] SK온이 중국 창저우 합작공장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양산에 들어갔다. 연간 5만t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배터리 생태계 확장에 힘쓴다. 중국 EVE에너지에 따르면 창저우 배터리 뉴머티리얼 테크놀로지(이하 창저우 배터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강소성 창저우시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리우 진청 EVE에너지 창업자를 비롯해 리 유후이 창저우배터리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과 리린 창저우시 상무부시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창저우 배터리는 SK온과 중국 배터리 회사 EVE에너지, 소재 업체 BTR이 작년 5월 세운 양극재 합작사다. SK온이 25%, EVE에너지가 24%, BTR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 회사는 작년 6월 28일 합작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약 1년 만에 준공, 지난달 29일 110t을 처음 출하하며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하반기 안으로 2·3 라인을 깔아 연산 1만t 생산체제를 갖추고 이어 4·5라인도 구축한다. 최종적으로 연산 5만t 생산량을 확보한다. 이는 전기차 약 47만대에 탑재되는 배터리 약 33GWh 생산에 쓰이는 양이다. SK온은 창저
- 오소영 기자
- 2022-07-26 14:45
-

CATL, 올 하반기 LMFP 배터리 양산…BYD·궈시안·EVE에너지도 가세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CATL이 하반기 에너지밀도를 보완한 리튬망간철인산염(LMFP) 배터리를 생산한다. BYD와 궈시안하이테크, EVE에너지도 개발에 뛰어들며 LMFP 배터리가 리튬인산철(LFP)을 이을 차기 배터리로 부상하고 있다
- 오소영 기자
- 2022-07-18 14:08
-
기획
[영상] K9·천무 이어 L-SAM까지? 에스토니아, 한국형 다층 방어망 도입 검토
[더구루=이진욱 기자]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유로(1조 772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장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유럽산 SAMP/T 등이 물량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한국의 고고도 요격 체계인 L-SAM이 유력한 대안이자 강력한 후보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이미 K9 자주포와 천무를 도입하며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L-SAM 수출 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구루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더구루 인사이트 영상 보기 ◇ 상세 기사 에스토니아, 한국산 K9 자주포·천무 이어 장거리지대공무기 'L-SAM' 도입 검토

-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1000km↑' 차세대 수소트럭 연내 생산…현대차 '엑시언트'와 경쟁 구도
[더구루=정현준 기자] 메르세데스-벤츠트럭(이하 벤츠트럭)이 올해 말 차세대 수소전기트럭(FCEV) '넥스트젠H2(NextGenH2)' 생산에 착수한다. 해당 모델은 한 번 주유로 1000km 이상을 달리는 성능을 갖췄다. 2030년 양산 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와 글로벌 수소 상용차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