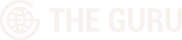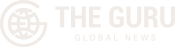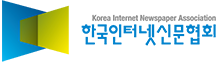[더구루=정예린 기자] LG그룹이 4월 중국에서 대거 특허를 확보하며 미래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터리·로봇·스마트 안경 등 전방위 기술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기술 방어전을 넘어 주도권 확보까지 노리는 모양새다.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따르면 CNIPA는 LG그룹 계열사가 2019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출원한 특허 총 370건을 승인했다. 특허 승인은 9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하루 평균 약 41건을 승인받았다.
지난달 확보한 특허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G전자가 가장 많은 134개의 특허를 승인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120개) △LG디스플레이(46개) △LG화학(45개) △LG이노텍(26개) △LG생활건강(2개) △LG경영개발원(1개) 등이 뒤를 이었다.
LG전자는 '전자기기(특허번호 CN119895309A)'라는 제목의 스마트 안경 관련 특허를 승인 받아 눈길을 끈다. 이 특허는 스마트 안경 특허는 시야각 조정 기술,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모듈, 그리고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착용감 개선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LG전자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강화하며 스마트 기기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의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LG전자가 스마트 안경 출시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2023년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휴고 스와트(Hugo Swart) 퀄컴 부사장 겸 확장 현실(XR) 부문 본부장이 "LG전자가 AR1 1세대를 활용한 스마트안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물론 로봇 분야에 대한 LG전자의 미래 전략도 엿볼 수 있다. LG전자는 '손가락 끝 교체가 가능한 로봇 시스템(특허번호 CN119858177A)', '로봇(특허번호 CN119836340A)' 등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생성 장치와 통신 장치 등에 대한 특허를 다수 취득, AI와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 안전성 향상 기술에 중점을 뒀다. 특히 황화물 및 고분자 기반 고체 전해질 관련 특허들이 다수 확인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화물 고체 전해질 및 제조 방법(특허번호 CN119856318A) △화염 배출 차단 장치를 갖는 배터리 모듈(특허번호 CN119895648A) 등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전극 건조장치(CN119895579A) 및 제조설비(CN119895578A) 등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특허도 함께 승인됐다.
LG그룹의 싱크탱크인 LG경영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AI 개발 성과도 나타났다. LG경영개발원은 'AI 기반 소재 구성 정보의 특성 데이터를 획득하는 시스템, 방법 및 매체(특허번호 CN119889527A)'라는 제목의 특허를 통해 소재 조성 및 구조 정보를 딥러닝으로 상호 학습하는 프레임워크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그룹 차원의 연구 개발 지능화 전략과 연결된다.
LG경영개발원은 LG경영연구원(옛 LG경제연구원)과 임직원 교육 연수 기관인 LG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020년 12월 AI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AI 전담 연구 조직인 LG AI연구원이 추가됐다. AI연구원이 더해지며 실적이 개선되며 최근 몇 년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시야각 조절 필름, 수분 차단 구조,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다수의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특히 유기발광소자(OLED)와 관련된 발광 구조 및 소재 조성물에 대한 특허인 '헤테로고리 화합물, 이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소자, 및 유기 발광 소자용 유기층 조성물(특허번호 CN119775267A)'는 국내 소재 기업 'LT소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LG그룹은 계열사 전반에서 걸쳐 '지재권 드라이브'를 걸며 차세대 먹거리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재·부품·제조 공정 등과 관련된 특허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LG화학은 탄소나노튜브 분산액,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자동차 내장재용 복합수지 조성물 등 지속가능 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및 고주파 반도체 부품 기술에 집중, 모빌리티·모바일 카메라 부품 경쟁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