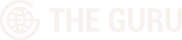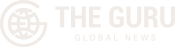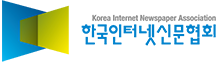[더구루=진유진 기자]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자원 무기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와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필수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수출통제법'을 제정하며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3년부터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필수 원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지난달에는 텅스텐·텔루륨·몰리브덴·인듐 등 5개 광물에 대해 추가로 수출을 통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의 수출 규제는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을 넘어 첨단 산업에 대한 전략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원광 뿐만 아니라 정제된 금속·화합물까지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대한 공급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갈륨·게르마늄 금속 대미 수출을 중단했고 흑연 원광 수출은 20% 이상 줄였다.
중국은 희토류·흑연·텅스텐·게르마늄 등의 채굴·제련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리·리튬·니켈·코발트 등도 원광을 수입해 정·제련한 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EU는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중국 광물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핵심광물 비축 확대 △재활용·대체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중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최근 수출 승인 절차를 무기한 연장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인 공급망 불안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