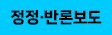[더구루=정등용 기자] 우리은행이 조병규 신임 은행장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조 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기업금융 명가’를 강조했다. 하지만 수익 개선과 조직 쇄신 등 과제는 산적해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기업금융의 명가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과 동반성장해 나가자는 주문을 내놨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채널을 신설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금융 영업력을 극대화하자고 당부했다.
조 행장은 “비금융 부문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해달라”며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과 명확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행장의 각오와 달리 우리은행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익 개선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주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가장 적은 당기순이익인 859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3위 경쟁을 펼쳤던 하나은행(9742억 원)보다도 1000억 원 이상 낮은 수치다.
수익 개선을 위해선 비이자이익 확대가 관건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비이자이익 비중이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비이자이익 비중은 하나은행이 1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 12.7%, 신한은행 11.6%, 우리은행 10.3% 순이었다.
조직 문화 쇄신도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이후 임원 인사 과정에서 계파 갈등과 낙하산 등의 관치 논란이 꾸준히 불거져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이원덕 행장이 모두 한일은행 출신인 반면 조 행장은 상업은행 출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 행장이 취임 이후 줄곧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성과에 앞서 그동안 해묵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