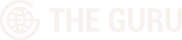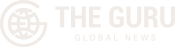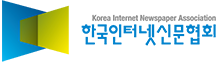#E3 리튬(ETL)
-

E3 리튬, 캐나다 탄산리튬 생산 연구시설 확장
[더구루=길소연 기자] 캐나다 E3 리튬이 생산 확대를 위해 연구소를 넓힌다.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통합시켜 리튬 생산 증대를 꾀한다.
- 길소연 기자
- 2024-05-15 07:30
-

캐나다 E3 리튬, 차세대 리튬 추출 기술 개발 앞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캐나다 E3 리튬이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접목한 파일럿 공장 시운전에 돌입했다. 리튬 추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상용화한다. 2일 E3 리튬에 따르면 화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 위치한 리튬 시범 공장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신공장에는 DLE 기술이 적용됐다. DLE는 염호에서 직접 리튬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저농도 염수에 흡착제를 넣어 리튬만 추출하고 나머지 물은 다시 호수로 돌려보낸다. DLE는 물을 증발시킬 필요가 없어 12~18개월이나 걸리던 기존 리튬 추출 기간을 2시간으로 단축시킨다. 같은 양의 소금물로 두 배 많은 리튬을 얻을 수 있다. 탄소 배출량도 적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리오틴토는 2024년 DLE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캐나다 스탠다드 리튬과 호주 레이크 리소시스도 각각 미국과 아르헨티나에 DLE를 접목한 시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E3 리튬은 사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시범 공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긍정적인 지표를 토대로 시운전에서 추가 데이터를 얻는다. 향후 타사의 DLE 기술과 비교하는 테스트도 수행하고 상용화를 선
- 오소영 기자
- 2023-09-02 00:00
-
테크
일론 머스크 보링컴퍼니, 유니버설 올랜도 터널 프로젝트 수주
[더구루=홍성일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터널 굴착회사 보링컴퍼니가 '유니버설 올랜도 터널 프로젝트(Universal Orlando tunnel project)'를 수주했다. 보링컴퍼니는 새로운 터널의 설계부터 건설, 유지보수까지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
방산
美 해군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건조 생산성 개선"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해군이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SSBN)의 생산성 개선에 나선다. 생산 지연으로 함정 인도가 늦어지자 2028년 조기 인도를 목표로 건조에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