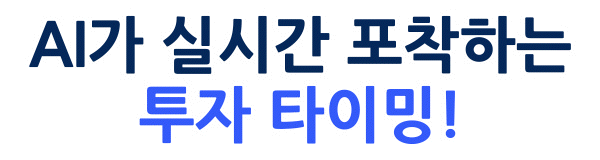[더구루=정예린 기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대기업·소부장 기업 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장기적인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단순한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춘 대만·중국이 실질적 이익을 선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특임교수)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12회 소부장미래포럼'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재와 미래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유기적인 생태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기술은 상용화까지 20~30년이 걸리지만 (대기업의) 위탁 경영자 체제 하에서는 이런 장기 연구가 평가받기 어렵다"며 "소부장 기업들은 작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더 깊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오래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는 20년 유효하지만 기술은 그 시간이 지나야 시장에서 쓰인다"며 "소부장 업체들이 진짜 소명의식까지 가지고 장기간 연구개발 하는걸 지원해야 한다"며 생태계가 이를 버텨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 유출 문제 역시 산업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자료를 들고 나간 건 잘못이지만, 일자리 없고 나이 많다고 밀려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배운 노하우나 실력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소부장 기업이 많고 커져야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구조적 허점은 마이크로LED 시장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국내엔 관련 패널 제조사가 거의 없고, 마이크로LED 제품은 전부 대만과 중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10년 뒤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도 "대만은 마이크로LED에 집중하며 하부 공급망까지 명확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우리가 마이크로LED 개발에 성공해도 결국 돈 버는 기업은 한국이 아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훌륭한 엔지니어가 기술 만들면, 기업은 시장 만들고, 정부는 인프라 만들고, 소부장 기업은 원천기술을 맡아야 한다"며 "5년 뒤엔 중국이 다 차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산업 구조의 특수성도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표는 "반도체는 작게 만들수록 좋은데, 디스플레이는 글래스 사이즈나 설비 크기를 더 키워야 하는 '경박장대' 산업"이라며 "그래서 코스트 싸움이 훨씬 치열하고, 장기 연구개발(R&D)와 공급망 설계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CD는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넘겼고, 스마트폰용 올레드(OLED) 조차 생산 능력에선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며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 BOE 등의 케파(생산능력)가 점점 커지고 있고, 국내 업체는 정체돼 있어 2029년 이후엔 장담할 수 없다"며 시장 주도권 상실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