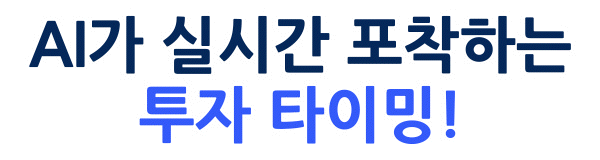[더구루=진유진 기자]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르네상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원자력 발전 핵심 연료인 우라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라늄 가격 상승과 러시아의 우라늄 수출 제한 발표 이후 미국 기업들은 텍사스와 와이오밍 등지에서 채굴을 재개하며 공급망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농축 우라늄 분야에서도 센트러스 에너지와 협력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농축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1년 만에 20kg 농축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더해 테네시주에 새로운 농축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원전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의 95%는 해외에서 수입된다.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27%), 카자흐스탄(25%), 러시아(12%)로, 특히 농축 우라늄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자국 내 핵연료 생산과 기자재 공급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건설·운영 비용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과 세액공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쓰리마일 1호기 원전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협력해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의 원자력 확대가 한국 기업에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원자로 기자재·유지보수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 대형 원자로 주기기 제조업체는 미국의 원전 수출 확대 과정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공급망의 보수성과 웨스팅하우스 등 강력한 현지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은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출력 증강 프로젝트는 미국 내 기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낙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공급망 자국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원전 업계는 현지화를 통한 미국 시장 편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직 기술이 충분히 성숙지 않은 4세대 원자로 등 선진 노형에 대한 미래 기술 개발과 기술 표준 제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 강화가 한국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이 미국 원자력 공급망 내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